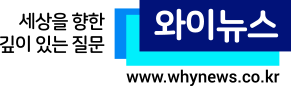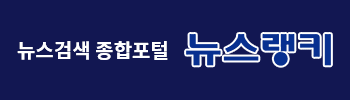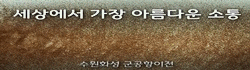-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한국의 공동체 문화는 그 전통이 뿌리 깊다. 농경 사회였기에 가족과 마을을 중심으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때로는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눠왔다. 한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우리'라는 표현에서도 이를 볼 수 있다.
“너무 지쳤어요. 삶도, 겪는 혐오도, 나를 행한 미움도. 오랫동안 쌓인 피로가 있어요. 미안해요.”
이는 최근 사망한 한 성소수자가 남긴 글이다. 기간제 교사이며 군인이었던 평범한 사람들이 성소수자로 ‘낙인 찍혔’고 결국 최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소수자란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동성애자, 무성애자, 범성애자, 젠더퀴어, 간성, 제3의 성 등을 포함하며 성정체성, 성별, 신체상 성적 특징 또는 성적 지향 등과 같이 성적인 부분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이를 말한다.
앞선 2월 인권위가 발표한 ‘트렌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응답자의 65.3%가 트렌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인터넷, 방송언론, 영상매체를 통해 트렌스젠더 혐오 발언과 표현 등을 접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이들은 일상적 용무를 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포기한 적이 있다고 밝혔는데 그 중에는 화장실 이용이나 화장실을 갈까봐 음료나 음식을 먹지 않았고, 군 복무 중 성희롱 성폭력을 당하기도 했다고 전한다.
이번 사망한 군인 출신 성소수자는 2017년 육군 부사관 임관 뒤 2019년 11월 타이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본인은 군 복무 계속을 원했으나 육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해 2020년 1월 강제전역을 결정했다고 한다. 인권위는 2020년 12월 14일 육군의 강제전역 조치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전역 취소 처분을 권고했다.
앞선 2월 24일에는 플루트 연주자이자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이기도 했던 정치인 출신 성소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성소수자 사회에서 자살기도, 죽음 소식은 특별한 일이 못된다. 마주하는 장벽이 그만큼 거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여러 군데에서 “사회적 타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나마 조금 희망적인 것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 관련 여론이 ‘개인 사정이므로 할 수 있다’는 응답이 60%로 늘었다는 것이다. 20-40대에서는 80%였다고.
일각에서는 서구 일부 나라와 같이 자신의 의사만으로 법적 성별을 바꿀 수 있어야 하고 의료적 성전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며 차별금지법도 당장 제정돼야 하고 국방부는 또 다른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트랜스젠더 장병이 복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사건들이 시사하는 점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같음’을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다수의 목소리는 ‘크게’, 소수 집단의 목소리는 ‘작게’를 박제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름은 같음의 반의어이고 틀림은 맞음의 상반되는 말이다. ‘틀리다’는 사전적으로 ‘옳은 것이나 표준적인 것이 아닌 상태가 되다’라는 뜻이고 ‘다르다’는 ‘같지 아니하다’는 뜻이다.
앞서 언급한 두 성소수자는 보통의 ‘무리’에서 다소 같지 않았을 뿐이지 결코 ‘틀린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틀리다’고 못 박은 것은 분명 틀린 것이다.
한국의 공동체 문화는 그 뿌리가 깊다. 눈물과 웃음과 나누며 힘을 합했던 것에는 일부의 조건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같음’이었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분화돼 가고 있다. 구성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위 두 성소수자에게 가해졌던 잔혹한 배격은 언제고 어느 때고 불특정 성원에게 똑같이, 혹은 더욱 확장된 형태로 가해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같음’을 강요하는 사회의 이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