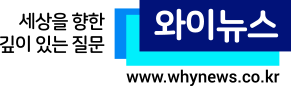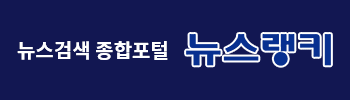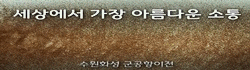-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펜기자 시절, 신문사 식구들과 점심으로 칼국수를 먹으러 갔을 때였다. 종업원이 물과 간단한 찬을 상에 내려주고 갔다.
“감사합니다.”
늘 하던 인사를 건넸다. 그 말을 들은 일행이 말했다.
“이 기자님, A 기자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사람이 쉬워 보여.”
“…….”
같이 ‘충언’을 들은 A 기자도 별다른 대꾸를 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 후에도 이런 인삿말은 계속 됐다.
또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다.
동일하게 장소는 식당이었고 그 때도 직장 동료들과 식사 자리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습관처럼 “감사합니다” 인사를 건넸다. 한 동료가 “왜 당연한 거에 ‘감사하다’고 하세요?”라고 물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답했다.
이것이 평소 지론(持論)이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언어(言語)는 한자로 풀자면, 말씀 言 말씀 語를 사용해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체계’라는 의미로 통용된다. 이 외에도 ‘사물, 행동, 생각, 상태를 나타내는 체계’,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는 의미들의 체계, 문법적으로 맞는 말의 집합, 언어 공동체 내에서 이해될 수 있는 말의 집합’ 등으로 정의된다.
영어(language)의 용어 풀이는 ‘the principal method of human communication, consisting of words used in a structured and conventional way and conveyed by speech, writing, or gesture’, ‘a system of communication used by a particular country or community’로 전해진다. 해석하자면, ‘구조화되고 관습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는 단어로 구성되며 말, 글 또는 몸짓으로 전달되는 인간 의사 소통의 주요 방법’, ‘특정 국가 또는 지역 사회에서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이라고 한다.
주로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정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사료된다. 즉,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말이나 글’이라는 수단인 ‘언어’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잘 알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바꿔 보자면, ‘표현해야 상대가 잘 알 수 있다’ 정도일 것이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이 숨가쁜 세상에서 상대도 ‘나’도 모두 살아가기에, 버거운 삶을 이겨내기에 바쁘다. 이 와중에 ‘말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자신의 진심(眞心)을 알 수 있겠는가. 그저 미루어 짐작할 뿐일 테지.
니체는 “모든 이해(understanding)는 오해(misunderstanding)”라고 말했다. 모든 말이 상대에게 진의(眞意)로 가 닿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이란 본래, 자신이 편한 방식 혹은 주관대로 상황과 상대를 해석하게 나름이니. 이러한 경우는 주로 메시지를 다소 장황하거나 복잡하게 전달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상황이 이럴진대, 자신의 의사(意思)를 명확하게 전달하려면, ‘말’을 해야 한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 아침마다 맞아주는 파란 하늘이 감사하고, 매 들숨에 ‘나’의 폐에 닿는 산소(酸素 Oxygen)가 감사하고, 때론 당연하게 여겨질지라도 ‘나’를 보고 웃어주는 모든 이의 미소가 감사한 일이다.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어떨까. 많은 것이 대체로 불확실한 인간사(人間事), 어쩌면 오늘이 이러한 마음을 표현할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잖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