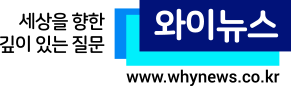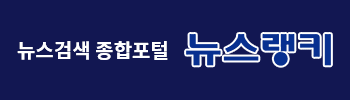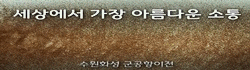-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노동자(勞動者 labor)는 힘쓸 로(勞), 움직일 동(動), 사람 자(者)를 써서 ‘힘을 써 움직이는 사람’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사전에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노동력을 판매하여 얻은 임금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나, 사전마다 약간의 해석 차이는 있다. ‘육체 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뜻도 있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보수로 받는 임금·급료 따위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해석도 있다. 모두 공통으로 근로자(勤勞者)와 동일하게 풀이하고 있다.
노동법(勞動法)에서는 노동자의 해석을 비교적 다양하게 정의한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어 3호는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명시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밝힌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는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근로기준법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개념을 더욱 넓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가진다. △종속노동성 △독립사업자성(경제적 독립성) △보수의 근로대가성 △계약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이다.
학계에서는 노동자의 개념을 두고, worker와 employee의 해외 용례를 연구하기도 한다. 더불어 일본의 진보학자들 사이에서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를 사회보장법의 범주에 산입해 일정한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논의도 일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동자’라 하면 대체로 제1차·2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듯하나, 명백히 화이트칼라(white-collar)나 실리콘칼라(silicon collar) 또한 ‘노동자’다. 한 대학교수는 자신을 “강의 노동자”라고 일컬으며 ‘깨인 사고’를 보여주기도 했다.
한국경제의 성장기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1960-70년대 산업은 주로 경공업과 섬유 시멘트 비료 정유 철강 산업이었으며 이러한 제2차 산업이 융성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첨단 산업발전은 찾아보기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책상에 앉아 ‘펜대를 굴려야만(요즘에는 컴퓨터 자판을 만져야만) 제대로 된 직장인’이라는 인식은 우리 사회 전체의 ‘독(毒)’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선시대 ‘힘든 노동’을 담당했던 노비의 수는 전체 인구의 40%라는 학계 추산도 존재한다. 시간을 더욱 거슬러 로마 시대에는 의사나 교사 등도 ‘전문노예’ 직종으로 존재했으며 이들은 식솔을 여럿 거느리고 대저택에 살았다. 2세기 중엽에는 노예들과 자유인들의 위상이 거의 비슷했다고 한다*.
노동자에서 갑작스레 노비와 노예를 거론하는 것은, 예전엔 이들이 담당했던 일들은 현대사회에서는 ‘노동자’가 맡고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혹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해서다. 100여 년도 넘는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 때 폐지된 신분제도가 아직도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팽팽하게 버젓이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은 아닐지 해서 말이다.
누구나 자신들이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원한다. 쉽게 표현하자면 ‘을(乙)’보단 ‘갑(甲)’의 자리에 서길 원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미 인지하다시피, 순식간에 많은 것이 바뀌는 현대사회에서 영원한 갑도 불변의 을도 존재하기는 힘들다. 자신이 구매행위를 할 때는 ‘갑’이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 노동력을 제공한다면 ‘을’이 될 수도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현대사회에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수천, 수만의 직업들이 존재한다. 그 모두를 이 사회 성원으로서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사회는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다. 서로를 이 ‘개미지옥’에서 구출해줄 수 있는 건 오로지 우리 자신들뿐이다. 세상에 불필요하고 경시받아야 할 직업은 없다. ‘나’도 ‘너’도 ‘저’도 ‘그’도 그저 삶을 더욱 생기있고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 자본이 필요하고 그렇기에 ‘신성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勞動者)’를 자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동일, 『로마법 수업』, 문학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