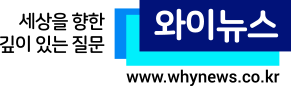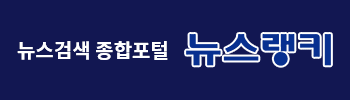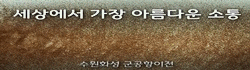-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중세(5-15C)는 신(神)의 사회였다. 이를 신중심 사회라고 사학에서는 지칭하는데, 일부는 이를 두고 약간의 라임(운율 rhyme)을 넣어 ‘신중중심(神中中心)’이라고 하기도 했다.
다음은 신민(臣民) 사회가 있다. 신민은 신하와 백성을 이른다. 이들의 중심엔 당연히 왕(王)이 존재한다. 신민과 백성은 하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왕을 위해 존재하며 왕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수동적 대상들이다.
상대적으로 다수의 보도자료를 접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관마다 동일 대상을 지칭하는 명칭이 각기 다른 경우가 꽤 있다. 어떤 곳은 주민(住民)이라고 하고 다른 어떤 곳은 시민(市民)이라고 한다. 확실한 것은 ‘주민’보다 ‘시민’이 더욱 민주화된 용어라는 것이다.
또 그러한 기관들에서 주최하는 기자회견을 가보면, 그러한 명칭과 그 기관 수장(首長)의 애티튜트(attitude 태도,사고방식)가 상당 부분 닮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경우도 보게 된다.
이를테면, 지금은 전직이 된, 수년 전 한 기관의 장이었는데 젊고 수평적 이미지가 당일 프레젠테이션의 콘셉트였는지, 면바지와 운동화 등 다소 캐주얼한 복장으로 공식 기자회견장에 등장했다. 손수 준비했는지 모를 PPT 자료를 띄우고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다.
손에는 레이저포인터를 쥐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는데, 문제는 발표 중간에 나타났다. 다음 화면으로의 전환이 잠시 늦춰졌고 그는 갑자기 “그거 말고 전에 그거”라는 식으로 평어체를 사용하여 프로젝터를 다루고 있었을 직원에게 ‘지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서 ‘문제’라고 표현한 것은, 활동적이며 스마트한 이미지메이킹까지는 좋았는데, 그에게 내재된 권위주의를 수평적 관계로 치환시키는 면이 다소 부족함을 그 짧은 순간에 숨길 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다음 선거 이후 그는 다시 그 자리에 설 수 없었다.
‘주민’의 ‘주(住)’는 사람 인변에 주인 주가 합쳐져 ‘사람이 머무른다’는 의미의 ‘살다, 거처하다’의 뜻을 갖는다. 반면 ‘시민’은 시 시(市)자를 사용한다. 노예가 있던 봉건시대에는 영주(領主)와 영지(領地)가 있었을 뿐 시(市)는 더욱 근대적인 개념이다.
또 ‘주민’이라는 용어 속에서 얼핏 읽히는 감(感)은 행정구역과 관료들에 의해 종속(혹은 지배)되거나 통제되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뉘앙스도 일면 띠는 듯하다. 또 약간은 정적(靜寂)인 분위기도 있어서 역동적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능동적인 대상인 시민을 지칭하는 것에는 조금은 모자라 보인다는 인상도 비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보다는 시민으로 지칭하는 것은 어떠한지 하는 것이다.
평생 동안 모아온 수억 수천만 원의 소중한 돈을 사기치려는 보이스피싱범을 잡고, 교통사고로 전복된 자동차를 자발적으로 모여 합심해 원상복구하고, 때로는 위기에 처한 이웃을 두 팔 걷어붙이고 돕는 이들을 이제는 ‘주민’이라는 개념에서 전환하여 ‘시민’으로 불러 보는 것은 어떨까*.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백성’에 의해 흘러 왔으며 사회는 시민으로 구성된다.
*물론, 많은 행정 및 법률 용어에서는 아직도 ‘주민’이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하루아침에 바꾸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