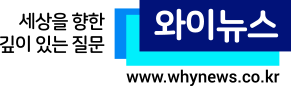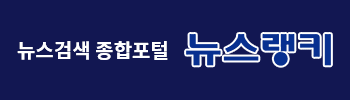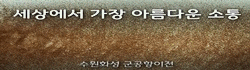- 편집국장 이영주
“여기 내빈석입니다, 다른 데로 이동해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이 먼저지, 내빈이 먼저야!”
친절하고 정중한 요청이었지만 일견 단호하고 일방적인 통고에 시민은 급기야 볼멘소리를 했다.
며칠 전 지역 행사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축제 주최 측의 수장(首長)까지 직접 나서 내빈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둔 것이다.
내빈들은 그 자리에 앉았을까. 그렇지 아니하다. 추후 문의한 결과 내빈들이 시민의 불평을 들었고 결국 애초 내빈석 두서너 줄 뒤에 앉았다.
공연장은 크게 세 블록 정도로 구성됐으며 그중 맨 앞줄이 내빈석으로 배정됐다. 내빈석임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식도 없었다.
내빈들은 공연을 끝까지 관람했을까. 그렇지 아니하다. 대부분의 내빈이 본공연 시작 한 시간도 채 안 돼 자리를 비웠다. 또 이것이 지역 행사에 참석하는 내빈들의 관행처럼 여겨지며 행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주최 측에 물으니 “의원님들이 바쁘시니까…….”라고 답했다.
그 무렵 도착한 내빈도 있었다. 공연 도중 늦게 도착한 내빈을 소개하는 것도 주최 측은 잊지 않았다. 소개를 받은 내빈은 무대 밑 중앙으로 나와 인사 발언을 하고 들어갔다. 공연의 흐름이 끊긴 것은 물론이었다.
축제를 준비한 주최 측은 무대 앞은 조명장치 등이 설치됐기에 안전상의 이유로 내빈석을 그쪽에 배정했다는 다소 설득력 떨어지는 해명을 내놓았다. 더불어 내빈석에 앉았다가 자리를 이동한 관객들에게 다시 가서 “앉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아침부터 공연을 진행했고 그때는 내빈들이 참석하지 않았기에 내빈석 표시가 없었다고도 했다.
요즘은 공연에서 내빈석을 만들어 놓지 않는 추세로 관객과의 벽을 짓는 것이 소통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어서라는 설명도 했다. 때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관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양보받는 경우가 있지만 당시 진행요원에게 내빈석에 관객의 착석을 금지하라고 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빠듯한 예산으로 잘하려고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시민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이 있다면 거듭 사죄드린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도 그럴 것이 행사에는 칠레, 아프리카, 터키, 러시아, 중국 등 다수의 외국 공연단이 참가했으며 그들을 서브하느라 손이 모자랐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동안에 주최 측의 수장까지 나서서 이미 시작된 공연을 즐겁게 관람하며 앉아있는 관객들에게 자리를 이동해달라고 내빈에게 과잉 친절을 베풀 동안에, 사전 취재 차 기사 작성 전 전화한 기자에게 “수원 소재 언론사가 화성까지 와서 이런 큰일도 아닌 건을 기사화하겠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닌가”하는 부정적 의심을 할 정도의 풍부한 상상력으로 ‘진짜 내빈’인 시민을 위한 기획을 해냈으면 어땠을까.
축제의 진정한 주체는 시작 전 잠시 얼굴만 비추고 부지불식간에 사라지는 ‘내빈들’이 아니라 쌀쌀한 가을 저녁 객석을 꽉 채워주고 손바닥이 붉어지도록 손뼉을 치며 환호를 보내는 그 이름 모를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