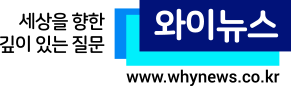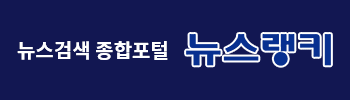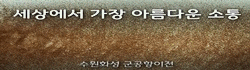- 편집국장 이영주
낙태(落胎)는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형법 제269조 제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제270조 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으며 앞선 8월 중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했으나 5기 재판부가 퇴임하면서 구성 중에 있는 6기 재판부 소관으로 넘겨진 상황이다. 2012년 형법 270조1항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재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시민단체는 형법 269조를 상징하는 숫자를 표현하며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앞선 8월 17일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포함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시행령을 공포하자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떨까.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상은 그다지 오래된 현상이 아니다. 불과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 많이 태어나는 아이들’ 때문에 고심했었다.
1962년 당시 보건사회부는 산아제한 정책이 담긴 가족계획을 최초로 발표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슬로건은 1960-‘70년대 정책을 나타내는 표어였다.
출산 억제를 위해 정부는 전국의 보건소에 피임약을 무료로 배포하고 남성의 정관 절제술을 권장하기도 했다. 1978년 서울시가 발표한 ‘올해의 피임 결산’에 따르면 매월 1만 4천 명의 여성이 피임약을 복용했으며 국가 차원의 이른바 낙태 버스가 운영돼 가임기 여성의 35%가 낙태를 경험했을 만큼 산아제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펼쳐지던 시기이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다.
결과는 필요 이상으로 성공적이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 2008은 193개국 가운데 한국의 출산율이 1.2명으로 최하위라고 밝혔으며 산아정책 도입 32년만인 1994년 정부는 이 정책을 포기했다고 전해진다. 1950년대 5명에서 1960년대 4명으로 정부의 권장 자녀 수는 줄었으며 급기야 1.59명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방향을 바꾸기에 이르렀다.
한 생명이 탄생하고 그와 더불어 성장하는 일은 분명 행복하고 신비로운 일이다. 그의 생애를 바라보며 하나씩 세상을 알려주고 공유하는 것은 때로는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소중하고 값진 경험으로 다가온다. 다만 이 전 과정을 여성에게만 전가한다거나 여성에게 더 큰 부분을 부과한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인간 생의 목적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자신이 뜻하는 바의 실현일 것이다. 이것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한때 교실에서 여학생의 수가 점점 줄어들었던 시기가 있었다.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사그라질 정도로 무가치하게 여겼던 그 ‘여성’들에게 이제는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며 출산율의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과히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들의 선택은 이미 결과다.